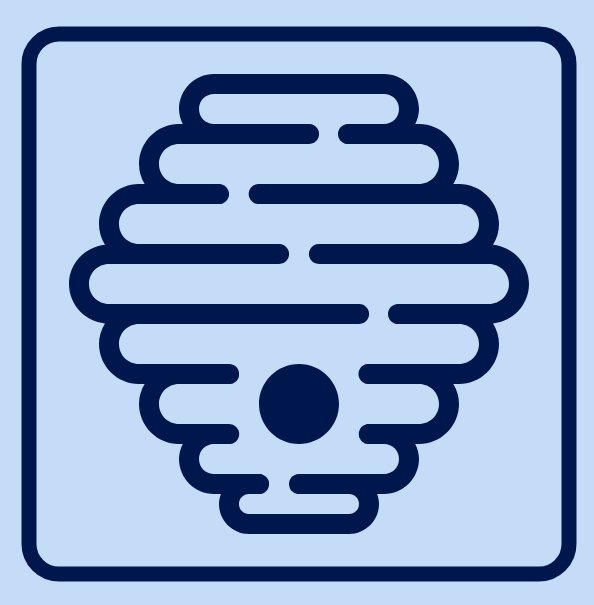전 세계 정부가 자주 AI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주권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 등 여러 국가가 독자적인 AI 모델을 구축 중이지만, 과연 이러한 막대한 투자가 현명한 선택일까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자주 AI’의 성공 가능성과 그 한계를 함께 탐색해봅니다.

자주 AI, 왜 전 세계 정부가 주목할까요?
전 세계 정부는 자체적인 AI 기술, 즉 ‘자주 AI’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문화적 특수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정부 자금으로 동남아시아 11개 언어를 구사하는 AI 모델을 개발했고, 말레이시아의 ‘ILMUchat’은 페낭의 ‘조지타운’을 미국 대학과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특화 지식을 자랑합니다. 스위스의 ‘Apertus’는 미묘한 스위스 독일어 ‘ss’와 독일어 ‘ß’의 차이까지 구별한다고 하니, 그 섬세함이 놀랍죠.
이러한 ‘자주 AI’ 프로젝트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벗어나, 각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AI 생태계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외산 AI 모델이 자국의 언어, 문화, 법률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데이터 주권 확보가 이 막대한 투자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인도의 AI 독립 선언: 외산 AI의 한계를 극복하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ChatGPT 사용자 수가 많을 정도로 AI 활용이 활발하지만, 외산 AI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딴 마을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 에이전트가 알아듣기 힘든 강한 미국식 억양으로 영어를 구사하거나, 인도 법률 스타트업이 메타의 ‘라마(LLaMa)’ 모델을 활용하려 했지만 미국-인도 법률이 뒤섞인 무용지물 답변만 내놓은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현지 개발사 소켓 AI의 창립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도 심각한데요. 인도 국방부는 중국 모델인 ‘딥시크(DeepSeek)’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라다크가 인도의 일부가 아니다”와 같은 왜곡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 때문이죠. 심지어 미국산 OpenAI 같은 시스템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 정부는 ‘인도 AI 미션’을 통해 약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체적인 국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켓 AI의 아비셰크 어퍼월은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과 달리, 인도는 막대한 자금 대신 우수한 인재와 핵심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Mistral)의 일부 모델과 비슷한 규모의, 작지만 효율적인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싱가포르의 전략: 지역 언어 및 문화 반영 자주 AI
싱가포르의 ‘AI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 ‘SEA-LION’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어, 태국어, 라오어, 인도네시아어, 크메르어 등은 미국 및 중국의 대규모 LLM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AI 싱가포르의 수석 이사인 레슬리 테오는 SEA-LION 같은 모델들이 챗GPT나 제미니와 같은 거대 모델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외산 모델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크메르어를 구사하거나, 무슬림이 많은 말레이시아 사용자에게 돼지고기 기반 요리법을 추천하는 등 지역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주 AI’라는 용어 사용에는 조심스럽지만,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하고 강력한 AI 시스템의 역량을 ‘스마트하게 소비’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투자, 과연 낭비일까요? 회의적인 시선들
‘자주 AI’ 개발에 대한 막대한 정부 투자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전략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트리샤 레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AI 시장을 ‘전격적으로’ 장악하는 상황에서, 중소 국가들이 LLM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며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한 자원 없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정부에 자문하는 AI 전략가 추 킷 찬은 “자주 AI 모델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전략으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시장을 이미 장악한 국제적인 제품들과 경쟁하는 대신, AI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데 동일한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챗GPT’나 ‘제미니’를 언급하며 자국 AI 모델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다국적 협력, 자주 AI의 새로운 돌파구?
치열한 글로벌 AI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찾으려는 국가들에게는 ‘협력’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베넷 공공 정책 대학원 연구진은 중소득 국가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공공 AI 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자원만으로는 거대 AI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답니다.
이들은 1960년대 유럽이 보잉에 대항하여 에어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던 사례에 빗대어 이를 ‘AI를 위한 에어버스(Airbus for AI)’라고 부릅니다. 이 제안은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 여러 국가의 AI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 대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주 저자인 조슈아 탄은 이미 최소 3개 국가의 AI 장관들과 여러 자주 AI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몽골이나 르완다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여전히 이 기술에 의존할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어쩌지?”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국적 협력은 ‘자주 AI’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국 정부의 자주 AI 투자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 소모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비판도 존재하죠. 과연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국적 협력이나 규제 강화가 더 나은 방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